과학기술정책대학원 신입생 인터뷰
인터뷰 및 일러스트레이션: 김재리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은 대로변에 위치한 빌딩과는 다르다. 약도로는 역부족이라 지도 앱 길찾기 기능으로 간신히 찾아갈 수 있는, 그마저도 막상 찾아오면 여기 맞나? 싶은 복합적인 정체성 때문에, 언제 걸었을지 모를 “우리가게 정상영업합니다” 표지를 찾아야만 들어갈 용기가 나는 그런, ‘외지적 좌표’를 갖는다.

그렇다면 이 외딴 장소에 새롭게 도달한 사람들에게 “여기는 어쩐 일로 오셨어요?” 묻게 되는 것이 꽤나 자연스럽다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부정도, 긍정도 담지 않은 순수한 호기심 말이다. 정말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 무엇이 그들을 이곳으로 이끌었을까? 어떤 내면의 엔진으로 추동되어서? 그 동기Driving force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Common Question: How did I end up at STP?
The Graduate School of Science, Technology, and Policy is not a building on the side of a highway. It has “out-of-the-way coordinates” that you can barely find with a map app’s directions, and even then, because of its complex identity, you wonder, “Am I in the right place?” and only feel brave enough to enter when you find a “We’re open for business” sign that you may have walked by at some point.
It’s understandable, then, that it’s quite natural to ask newcomers to this remote place, “What brings you here?” Pure curiosity, with no negatives and no positives. How did they really get here? What drove them to this place? What inner engine is driving them? I ask about the driving force.
MBTI는 인터뷰어 자체 제작 약식 검사 결과다.
약식 MBTI (by jerryk, 실제 정식 검사로서의 MBTI와 무관함)
- 친한 친구 모임에 낯선 사람이 갑자기 올때: 아,그래? (E) vs. 잉? (I)
- 여유 시간은:머리를 비우고 있는 시간 (S) vs. 망상하는 시간 (N)
- 더 위안되는 것:무조건적인 지지 (F) vs. 논리에 근거한 지지 (T)
- 예상에 변칙 발생시:불안이 크다 (J) vs. 흥분이 크다 (P)

MBTI: ENFP (J성향 있음)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
얼마 전 리더십 강의에서 크래프톤 창업자이신 장병규 회장님 강연을 듣게 되었다.
그날 의사결정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낸다는 말씀을 해주셨다. 나는 사실 학부 때 과학과 STP 사이에서 고민하면서 내 정체성이 어디로 기울어 있나 2년 정도 생각해봤다. 하지만 답이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재능 측면에서도 과학계에 남거나, STP에 오는 것에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신기하게 지금까지 해온 의사결정을 토대로 거꾸로 생각해보면, 내 정체성이 보이는 것 같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문제해결을 좋아했다. 그리고 중학교 사회 시간에 원자폭탄, 프랑스 혁명, 우생학에 대해 배우게 되면서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모의 유엔과 같은 행사에도 참여했지만 명확한 해결책은 없었다. 어쩌다보니 과학을 하게 됐는데, 과학만의 명확함이 좋았다.
그러고 학부에 진학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접한 책이나 이야기들이 내 안에 있던 어떤 물음들을 발굴하게 했다. 나 자신보다도 주변 사람들이, 내 내면에 있는 어떤 가치에의 추구를 꺼내준 것 같다. 대개는 친구들이었다.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나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대학교 와서는 같은 학과 친구, 학생회를 함께했던 친구… 실험하다 만나게 된 친구, 랜덤으로 룸메가 되어 인연이 된 친구 등등.. 학부 마지막 순간에도 이들의 진심 어린 이야기가 나를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주었고, 그렇게 학부 끝자락에 나는 과학기술학을 선택하게 되었다.
크게 봤을 땐,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 각 자리에서의 의사결정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기준을 세우는 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이뤄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많겠지만, 그중에서도 지금까지의 나의 여러 선택들이 모여 만나게 된 과학기술학, 또는 과학기술정책이 나에게 맞는 선택이 아닐까.

MBTI: INTJ (F성향 있음)
“사람만 살리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과학고에 진학한 때부터 시작할까. 1학년 때 물화생지 중에 전공을 선택하는데, 이 중 “멋있는 걸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다(멋의 기준은 천문학이다). 그때 고른 게 ‘환경생태공학’이었다. 그 당시에는 환경은 부상 중인 이슈였고 지금처럼 대중적이진 않았기에, 나만의 아젠다를 펼치기에 적합한 환경이라 생각했다.
대학에 가보니, 천문학만큼이나 환경에도 열정적인 사람들이 많았다. ‘단풍잎돼지풀’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 새벽부터 연천에 가서 낫질을 했다. 그들의 순수한 열정에 다소 이질감을 느꼈던 것 같다. 그래서 부전공을 가장 다른 것으로 하자, 라는 마음에, 생명공학과는 다른 극단에 있다고 여겨지는 종교학을 부전공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공대생을 (원치 않게) 대표하게 되어 여러 질문을 받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믿냐?”와 같은 믿음에 대한 질문들이 사회에서 날것으로 맞부딪히는 것을 보며, 종교학 대학원을 갈까 하는 생각까지 했다. 이때 어느 교수님이, 네가 과학을 한 것에도 뜻이 있을 테니, 믿고 진행하라, 는 말씀을 해주셨고, 이에 고민 대신 닥치는 대로 해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프로그래밍 랩에 가봤다. 해당 랩에서 미생물 진화 동정 프로그램을 다뤄보며 진화생물학을 프로그래밍으로 풀어보는 것에 흥미를 느껴, 교수님의 회사에서 연구와 일을 병행했다. 그러나 의생명계통으로 전환되는 회사의 방향을 보며, 여러 고민을 하게 되었다. 당시엔 프로그래밍이 재밌었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회사에 가서 계속했다.
Q. 이런 다양한 흥미본위가 ‘의학’은 피해가는 듯하다.
“의학”의 가치에 대해 꾸준히 의문을 가져왔던 것 같다. “사람만 살리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태, 환경은 포섭적이고, 확장적이며, 지속가능성과 같은 사회적 논의를 다루지만, 의학은 경제논리에서 분리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Q. 전 직장에 대한 인터뷰어의 질문
한마디로는 “멋”있는 회사였다. 피를 분석해서 질병의 가능성을 분석, 리포팅하면 의사가 진단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다. 그 안에서 본인은 문제아 포지션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멋”있는 일을 한다는 의식에 열정을 불태우는 실리콘밸리 스타일 스타트업이었는데, 체계가 다소 없는 편이라고 느꼈고, 그러다보니 체계의 가치를 다시금 느꼈다. 이에 STP를 선택하게 되었다. 프로그래밍은 여전히 아주 재밌다. 그쪽으로 가버릴까도 생각했었다. 이러한 선택에 주변에서도 적극적인 지지를 실어주어서 여기까지 도착할 수 있었다.

MBTI: INFJ (E성향 있음)
“인간은 도왔기에, 연대했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
화학 공학이 메인인 학과를 전공했다 보니 주변에는 반도체회사 간 친구들이 많은데, 나의 경우 보다 직접적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제약 회사를 택했다. 다수의 노동자들이 그러하듯 일을 하다 보니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나는 왜 누군가를 돕고싶어 하지?” 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되었고 ‘내가 하는 일이 세상에(환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같은 거시적인 고민을 하고 싶어졌다 .
사실 처음에는 직접적인 감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스타트업이나 연구실을 가는 고민도 했고, 그러다 모든 노동자가 자신이 무얼 하는지 느끼면서 일하는 것은 아니지, (즉 이게 당연한 거지, 하며) 버티기도 했다.
나는 왜 남을 돕고 싶어 하는가. 나는 그렇게 능력이 엄청난 것도 아닌데. 하면서 인류학 책을 찾아 읽기 시작했다. “인간은 도왔기에, 연대했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가 책을 읽으면서 얻은 결론이었다. 나는, “불안해서” 어쩌면 생존본능으로 (혼자서는 잘 살아낼 수 없겠다는 것을 느껴서) 다같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내가 하는 일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회사는 기본적으로 영리집단이므로 (특히 의료산업복합체의 경우) 사람을 살릴 때 “어떤 사람”을 살릴 것이냐 결정하는 것부터 많은 권력과 이익이 얽힐 수 밖에 없는 일이었다. 개인적으로 좀 더 가치추구적인 일, 거시적은 관점을 갖고 무언가를 고민하는 일을 하고 싶었다.
다양한 방식이 있을 것이다. 현장에서 (글자 그대로) 목소리를 내는 활동가들도 있다. 그와 비교했을 때 연구라는 분야가 너무 “고상”해 보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당사자나 직접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이 아닌 다양한 현장의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낼 때 더 단단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과학 공부를 한 장점을 살려서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는, 과학을 거시적으로 보는 학문이 내게 필요했고 그때 접한 게 STS다. 그때부터 STP를 준비해 오게 되었다. 회사에 다니면서 짬짬이 휴게실에서 토플 강의를 듣는다거나 점심에 산책을 하며 면접준비를 했고, 합격 소식도 회사에서 확인했다 (일동 충격). 전화 부스에서 확인하고, 광대가 안 내려가서…. 그러고 웃으면서 실험하러 내려갔었다. “끝까지 본업을 (잘) 마쳤습니다.”(일동 환호).

MBTI: INTJ (MBTI 좋아하지 않음)
“사람들이 고통받는 사회는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가.”
학부에서 심리학을 전공하다 사회학으로 전과하고, 철학을 함께 전공했다. 이후 사회학으로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바로 STP 박사과정에 진학하게 되었다.
Q. 심리학 전공으로 시작했는데.
목동 출신이다. 목동의 학생들은 학원에서 살다시피하며, 불행한데, 부모라고 행복한 것도 아니다. 이처럼 모두가 고통받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찾은 것이 상담이었고, 정신적 불안 등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다. 어렸을 때부터 좀 더 근본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있었고, 원래는 이과에서 물리학 쪽에 관심을 갖다가, 이런 이유로 문과로 전향해 심리학을 전공하게 되었다. 그런 근본적인 것에 대한 관심에 바탕해 심리학, 철학과 같은 데에 흥미를 가져왔다.
Q. 전과하게 된 직접적 계기가 있는지?
암기 위주로 진행되는 심리학 공부가 맞지 않았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조명하는 것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식, 문화, 권력>이라는 사회학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 강의하신 김경만 교수님께서 지식사회학을 하시는 분이었고, 수강하며 ‘이거다’ 싶어 사회학으로 옮기고 석사도 그분 밑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석사과정 당시에는 (과학)지식사회학적 관점에서 블루어-라투르 논쟁으로 연구를 수행했다. ‘사회의 종말’을 고하는 라투르의 사회학 비판. 사회학은 ‘associology’라고 재정의되어야 한다고도 하지 않나. 이처럼 라투르는 사회학을 버리려고 하는데, 사회과학자들은 그를 잡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왔다). 따라서 ‘사회학의 종말은 선언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석사논문을 쓰게 되었다.
(인생의 멘토와도 같던) 지도교수님이 석사 졸업 즈음 은퇴를 하시게 되어서, 살길을 다시 찾아야 했다. 학부 시절 프랑스철학에 관심이 많았는데, 다소 뜬구름 같지 않은가 싶었다. 당시에는 현학적인 것이 잘 쓰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김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이 뜬구름과도 같은 철학이 기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명료함이란 무엇인가, 에 대해 처음 마주쳤다. 김 교수님은 이론과 실천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론가들은 인식론적 특권을 가질 수 있는가, 그렇다면 지식의 역할은 무엇인가? 와 같은 질문을 던져주셨다.
사람을 해방시킨다는 것은 무엇일까?에서 시작해서, 개인적인 차원에 주목하며 심리학으로 (고등학교 때) 이동했다면, 거기서 더 넓은 차원에 주목하며 사회학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Q. 두 가지 다른 흥미가 함께하는 것 같다.
사람들이 고통받는 사회는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가와 근본적인 것에 대한 개인적 흥미본위가 함께할 수 있는 것이 과학지식사회학이라고 생각한다.
고통이란 무엇인가? 지식사회학 이전까지만 해도 고통과 그로부터의 해방이 존재한다고 생각했는데, 지식사회학을 공부하면서는 달라졌다. 그전에는 고통이란 그냥 추상적으로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었으나, 지금은 정신질환, 정신의학 및 심리학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탐구를 하고 있다. 물론 정신질환이 실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것이 실재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 관심이 있다.
Q. 해당 연구가 STP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부분은?
말했듯 지도교수님께서 은퇴를 하셔서, 지식사회학을 그대로 연구하기엔 어려움이 있어 과학사회학/철학/사학을 찾다가, 과학철학보다는 케이스스터디를 하고 싶은 마음에 관련된 연구를 하시는 분을 물색하게 되었다. 찾다 보니 박범순 교수님을 알게 되었고, STP라는 곳에 계신다고 하여 부랴부랴 준비했다. 6월 석논마무리하고, 바로 준비해서, 2주 정도… (인터뷰어 충격)

MBTI: ESTP (J성향 있음)
“흐름을 따르고, 과정을 신뢰하고, 순간을 살아라.”
어떻게 과학이 정책 형성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 학부 과정에서 느끼게 되었다. STP에 있는 모든 연구실이 흥미롭다고 생각한다. 과학기술정책은 우리의 삶에 포용되어야 하며, 민주적이고 정의로우며 다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현대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기술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AI와 같은 다양한 과학기술의 필드가 어떻게 사회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Q. 학부 당시 수강한 흥미로웠던 강의?
Local Governance: 어떻게 한정적 시간 안에 과학기술이 통합되는지, <E-governance and digital governance. (by Dr. Ume Laila HoD)>.
한국에서 5년간 살았었다. 아버지가 KAIST Nuclear Physics 석사과정 재학하신 2005-2010 당시 대전초등학교에 다녔다. 지금은 한국어를 많이 잊어버려서 공부 중이다.
Q. 어렸을 때의 경험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인가?
한국은 과학기술에 있어서 강하다고 생각했다. 한국 자체에 대한 향수도 있었고, 문화적으로도, 절이나 한자 같은 것을 좋아하고, 한국인의 원만하면서도 열심히 하는 성격 easygoing and hardworking을 좋아한다.
Q. 왜 공공정책인가?
10-12학년 때, 물리와 화학을 좋아했는데, 대학에서 전공할 정도의 관심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파키스탄 No.1의 Public administration 학교인 NUST에서 디지털, 로컬 등의 거버넌스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배울 수 있었다. 다양한 필드와 섹션에 대해서 알게 됐기 때문이다.
Q. 최고의 대학이라면 공부 열심히 했을 것 같다.
열심히라기보단, 나는 똑똑하다고 생각한다.(웃음)
Q. NUST에선 전공을 어떻게 선택하나.
5학기때부터 전공을 시작한다. 그전까지는 다양한 과목들, 경제학, 심리학 등을 수강한다. 통계는 별로 안 좋아했고, 거시경제나 정치학 등에 흥미가 있었다. (기술-에 대한 흥미는 어디서 왔는지?) 왜 기술은 정부에게 적극적으로 다뤄지지 않는가?를 오랫동안 생각해왔다. 보다 뉴스 매체 등을 익숙하게 접해왔고, 거기서부터 관심을 가져왔다. 국제뉴스는 알자지라, 뉴욕타임즈 등, 국내지로는 DAWN in pakistan 등을 읽는다. 우르두와 영어로 발행되는데, 영어가 더 편하다.
Q. 파키스탄의 언어는?
우르두가 공식 언어지만, 모국어는 각자 출신지에 따라 다르다. 펀자브, 신드 등… 나는 펀자브가 모국어지만, 발루치나 파슈토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다.
Q. 한국으로 모험을 떠날 마음은?
뉴 월드로 가는 마음이 신나긴 했으나, 공항에선 늘 사랑하는 사람들을 놓고 온다는 데 감정적이 되긴 한다. 22년에 학위를 마치고 은행 쪽에서 일했지만 적성에 맞지 않았다. 그때 아버지가 KAIST를 추천해 주셨다.
Q. 궁극적인 목표는?
나는 장기 목표는 믿지 않고, 단기 목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흐름을 따르고, 과정을 신뢰하고, 순간을 살아라(Go with the flow. Trust the process. Live the moment).

MBTI: ENFP
“If no one cares, then I will.”
“If no one cares, then I will.”
I am interested in improving the approach to influence the accurate parts and enable just policies in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in Indonesia. With policy studies, technology capabilities can result in better societal gains. STP offers a unique master’s degree that focuses on science, technology, and public policy, highlighting the vital role of designing digital technology policies.
Since I worked at Telkom Indonesia, I have realized that Indonesia has an immense promise to be a prosperous digitized country, which has motivated me to contribute to ensuring the current and new digital technology capabilities are well implemented in Indonesia. I have learned that the company has been involved in many discoveries and methods for authorizing new and advanced digital technology in Indonesia. Despite the progressive extension of Indonesia’s internet connectivity, I found a disparity in regulatory practice through local authorities, leading to a deficient agreement for the deployment’s permission. Concerning the missing pieces, I am driven by the potential to improve the approach and influence the accurate parts, enabling just policies in developing digital technology in Indonesia. I firmly believe that with well-designed policies, technology capabilities can lead to significant societal gains.
South Korea has been a leader in digital technology, especially in the field of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which brought me to KAIST as the best institution to study technology. I wanted to learn from the best place to support my intention of becoming a decent leader in this industry.
KAIST STP offers a unique master’s degree focusing on science, technology, and public policy, underscoring the vital role of designing digital technology policies. The many courses offered by STP inspire me to explore further the effectiveness of governing digital technology and to focus on real-world societal, political, and economic challenges.
I aim to broaden my perspective in researching evidence-based policymaking impact studies on digital technology issues, ranging from compromising the forthcoming demand for internet connectivity in rural locations to finding solutions in substantial stored data breach possibilities in digital systems. Being admitted to the KAIST STP will allow me to build more connections and further uncover my potential. Hence, I can continue contributing to the ideals of this industry.

MBTI: INTP (MBTI에 대한 확신이 없어 동생과의 질답을 전해주었고, 인터뷰어가 요약)
“뭔가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내향형: I(내향)의 정도가 심하면 낯선 이에게 말 걸기가 힘들 텐데, 그런 정도는 아니다. 그렇지만 혼자서 충전하는 시간을 필요로하는 타입인 것으로 보인다.
사고형 (T): 그 정도가 심하다고 생각한다. 위로를 요구했다간 “네 잘못이 있네” 식으로 반응하기 일쑤라 요구하지 않게 된다. 문제 해결을 공감보다 우선하지 않나. 본인의 옳음을 증명하려 하는 편이다. (너무 나쁘게 보이지 않느냐는 당사자의 물음에 동생이 고쳐 말하며) 조언을 빠르게 줄 수 있고, 공정한 판단을 하려 노력하는 편이 아닌가. 그 외엔 잘 모르겠다.
인식형 (P): 중요한 일이 있으면 계획을 짜려는 편이지만, 기본적으로 일상에서는 무계획을 즐기는 편으로 보인다. 일할 땐 계획, 일상에선 무계획이 아닌가. 루틴을 잘 지키지만, 루틴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너그러운 편이라 J 성향이 있는 P로 생각된다.
(동생과의 질답은 여기서 끝난다. 직관형N에 대한 응답이 없는 것이다. 이에 110자로 된, 인터뷰어 자체개발 약식 검사의 결과 요청에 900자의 질답으로 응한 것에 미루어 망상형으로 여겨지곤 하는 직관형N 성향이 강하다고 추론할 수 있겠다.)
(이하는 왜 STP에 왔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서면 응답, 수정하지 않음)
a. 라인홀트 니버가 쓴 기도문 중 이런 문장이 있다. ‘주여,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은혜와 바꿔야 할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스스로를 종교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런 문장을 맞닥뜨리면 생각이 많아진다. 사실이다. 바꿀 수 없는 것에 매달리다 보면 사람은 불행함에 사로잡히기 마련이다. 그래서 나는 생각했다. 그러면 나는 바꿀 수 있는 자리로 내가 갈 수밖에 없겠다.
b. 정책을 만드는 건 참 어려운 과정이다. 우선 문제 인식이 옳아야 한다. 예산 편성이 완벽하고 실현 가능성이 아무리 높다 한들, 그 방향성이 옳지 않다면 없느니만 못할 수 있다. 그다음은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가장 고된 과정일 수도 있으나, 문제를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마지막엔 증명을 해야 한다. 왜 이것이 문제이고 왜 이 정책이 시행되어야 하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을 해야 한다. 내 생각이 틀렸다면 처음으로 돌아가 어디서부터 틀렸는지 점검해보기도 해야 한다.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그 생각을 증명하는 법을 익힌다. 내가 과학기술정책대학원에 온 이유다.
c. 과학기술정책대학원에 들어오면 이런 말을 듣는다. ‘여기는 뭔가에 화가 난 사람들이 와요.’ ‘여기 온 사람 중 사연 없는 사람은 없어요.’ 스스론 그다지 자랑하고 다닐 만한 사연이랄 게 없는 재미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건 모두가 비슷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요즘 세대 치고 근 10년 간의 정책에 아무런 불만이 없었던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말을 하지 않고, 시대에 순응할 뿐이다. 그렇게는 살고 싶지 않았다. 뭔가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MBTI: INTJ
“오 좀비 입 벌려서 바로 내 손을 넣어!”
(인터뷰어의 질문에 서면 응답)
“저 과학자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이지? 너무 궁금해!”
제 회사 동기가 얼마 전 저의 성격을 묘사하며 해준 말이 있습니다.
동생 : ‘만약 좀비 아포칼립스가 도래하면, 언니는 세상에서 제일 먼저 죽을 사람이야. 언니는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좀비를 보면 궁금해서 바로 손 내밀어!’
나 : ‘오 좀비 입 벌려서 바로 내 손을 넣어!’
저는 경제학을 전공하고,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공공기관에 재직 중입니다. 제 주변 친구와 동료들은 대학원을 선택할 때 기술경영, 경제성장론 분야를 주로 선택합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친숙한 질문들은 ‘어떤 기술에 투자를 해야 하는가?’ ‘어떤 방식으로 R&D를 지원해야 하는가?’였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 과학기술이란, 연구장비, 연구인력, 연구개발비 등의 투입물을 넣으면, 기술이나 혁신, 특허라는 것들이 튀어나오는 가챠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투입-산출 방식의 이해는 큰 범위의 경제 정책을 다루기에는 유용해 보이지만, ‘과학기술정책’의 세부적인 요소를 볼 때에는 제가 아주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특히 과학자가 하는 말을 이해하기 어려운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관료가 인용지수로 성과지표를 만들고자 한다면, 과학자는 학문마다 다른 인용 특성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반문합니다. 학문마다 다른 인용 특성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관료가 기초과학보다 응용 기술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과학자는 기초과학이 있어야 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반문합니다. 기초과학은 왜 기술이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관료가 이해충돌방지 때문에 상호 연구 평가를 금지하고자 한다면, 과학자는 그렇다면 평가단이 해당 분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로 채워질 것이라고 반문합니다. 과학지식의 어떠한 특성이 동료 평가라는 체계를 만든 것이며, 동료 평가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과학자의 세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세계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과학계는 무언가 다른 규범을 갖고 있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관계 맺고 있으며, 다른 방식의 생산과 유통, 소비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이해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과학기술정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 궁금한데요. 과학자의 삶과 하루의 일상은 대체 어떤 것일까요? 좀비에게 물려 좀비가 되어보듯, 과학자에게 한번 물려보면 과학자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게다가 과학자에게는 물려도 병에 걸리지도 않습니다. (아마도요.)
다행히 KAIST에는 과학자들이 아주 많이 있고, STP에는 과학자의 행동 하나하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신입생으로서 앞으로의 STP에서의 배움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MBTI: ENFP (J성향 있음)
“사람들이 고통받는 사회는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가.”
Q. 10년에 이르는 신문 및 방송매체에서의 경력과 관련한 경험 중 과학기술정책대학원으로 이끈 경험이 있는지.
우선은 후쿠시마에서 사고 현장을 직접 보았을 때, 안전함을 확률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어렵다는 걸 시퀀스로서 보게 되었다. 2013년에는 밀양의 송전탑 취재를 가게 되었는데, 단순히 고압전선이 건강에 안좋다를 떠나, 그런 위험을 지역에 외주화하는 구조를 의식하게 되었다. 2017년에는 신고리 5,6호기 취재를 갔는데, 울산에 들어서는 이야기를 하는 현장에 울산 지역 당사자는 오백 명 중 여덟이었다. 석사로 KAIST에서 과학 저널리즘을 공부했는데, 더 구체화하려면 학문으로서 STS에 대해 좀더 공부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널리즘에서는 다루지 못하는 깊이 있는 지점에까지 탐색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나를 여기로 이끈 것 같다.
Q. STS 방법론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있는지?
서울대 홍성욱 교수님이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서 논하실 때 관료제의 관습적인 문제를 다루었던 게 당시 저를 비롯한 일부 기자들에게 인사이트를 크게 주지 않았나 하고 생각한다. 보통 기자는 데스크 및 당시의 검찰 등에서 짚어 주는 장면을 중심으로 살피게 되는데, 당시 홍 교수님은 각 정부 부처가 책임을 미루고 회피하고, 국무총리 차원 범부처 국무조정이 2차례나 실패하며 2만 명이 넘는 인재를 초래하는 네트워크 자체를 지적하셨다. 당시, 한 가지 사안에 대해 출입처에 얽메이지 않고 깊이있게 취재하는 탐사보도에 대해 유의미하게 보고 있는 본인 입장에서는 이런 네트워크적 시각이,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더 가치있고 의미있는 방식으로 다가왔었다.
Q. 현장에서 소수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는 못하는 미시 단위의 문제와, 네트워크적 조망과 같은 거시 단위의 방식을 함께 예로 들어주었는데, 겉보기에 상반된 듯한 이런 차원을 어떻게 교차해낼 수 있을지?
귀납법이라는 측면에서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스트레이트 기사는 주로 연역적으로 쓰인다. (스트레이트 기사와 피처 기사: 뉴스 기사는 스트레이트 기사(Straight news)와 피처 기사(Feature story)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스트레이트 기사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목적으로, 가능한 간결하게 작성한다. 피처 기사는 사건을 심층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사이다. 박종화. (2003). 미디어 문장과 취재 방법론. 한울아카데미.) 소위 ‘야마’를 잡아놓고, 뉴스 ‘꼭지’ 잡아놓고 그로부터 내려가는 것이다. 그에 반해 탐사보도 같은 피처 기사는 귀납적으로 쓰인다. 구체적인 사례로부터 확장해나간다. 그런데 피처 기사는 일반적으로 장시간의 취재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데 아날로그 미디어 환경과는 달리 디지털 환경에서는 주어진 시간 안에 기사를 계속 마감해야 해서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내야하는 스트레이트 기사 같은 경우 어느 정도 AI가 대체하고 있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기술과 매체가 공존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2021년 4월 일본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기로 결정하면서, 그리고 1년 전 같은 4월에 방류를 시작하면서 오염수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삼중수소’가 인간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여부다. 누군가는 위험의 가능성이 적다고, 크다고, 혹은 알 수 없다고 말한다. 확률 문제라고 주장하는 셈이다. 이건 일본 후쿠시마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경주 월성원전 인근에서도 10년 넘게 같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마을 주민 대부분이 갑상선 암과 계통 질환을 호소하면서 소송까지 불사했지만 지난해 8월 부산고등법원에서 진행된 ‘갑상샘암 공동소송’의 2심의 결과는 원고 패소로 끝났다. 국내 원전의 방사능 피폭으로 갑상샘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618명과 그 가족 2882명이 직접 그 인과관계를 밝혀야 했지만, 이는 불가능했다. 한국의 한 주요 방송사가 월성원전 내부 균열과 방사성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중수 유출 등을 단독으로 보도했는데, 이를 놓고 양쪽으로 진영이 갈리고 갈등만 거세지는 형국이다.
반갑게도 최근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한 연구팀이 삼중수소의 위해가 너무 드러나지 않았다며, 그 이유를 관련 연구 부족에 있다고 꼽았다. 위해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로 위험 가능성을 방치하면 위기가 온다. 우리 사회를 계속되는 위험 가능성에 노출시키고, 위기 형국으로 몰아가는 사회적 구성물은 무엇일까.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으로 STP에서의 생활이 기대된다.
–
소개를 마무리하며: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은 미래지향적이다. (과학, 기술, 정책이 각각 가리키는 것을 생각해보라.) 공식 홈페이지의 구성원 소개에는 이들의 목표와 꿈이 잘 담겨있다. 그러나 역사를 잊은 미래가 위태롭듯, 한 사람의 인생사를 모른 채 꿈만 듣는 것은 어딘지 아쉬운 구석이 있다.
벚꽃 만개한 봄이다. 꽃이 필 때면 깊이 내린 뿌리가 동토를 어떻게 버텨내었는지 생각하는 것이, 꽃의 아름다움을 경이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지 않던가. 잠깐이나마 들어본 이들의 삶은 지면의 한계로 압축하는 것이 가슴 아플 만큼 깊이 있고 특별했다. 이러한 삶들의 가치가 닿아야 할 곳에 가닿아 다른 이의 이야기를 또다시 이끌어내는 마중물이 되길 바라며 기획한 신입생 인터뷰, 즐겁게 읽으셨기를.
– 3월 말, 대전 KAIST 인문사회과학부 건물에서,
진행자 Jerry 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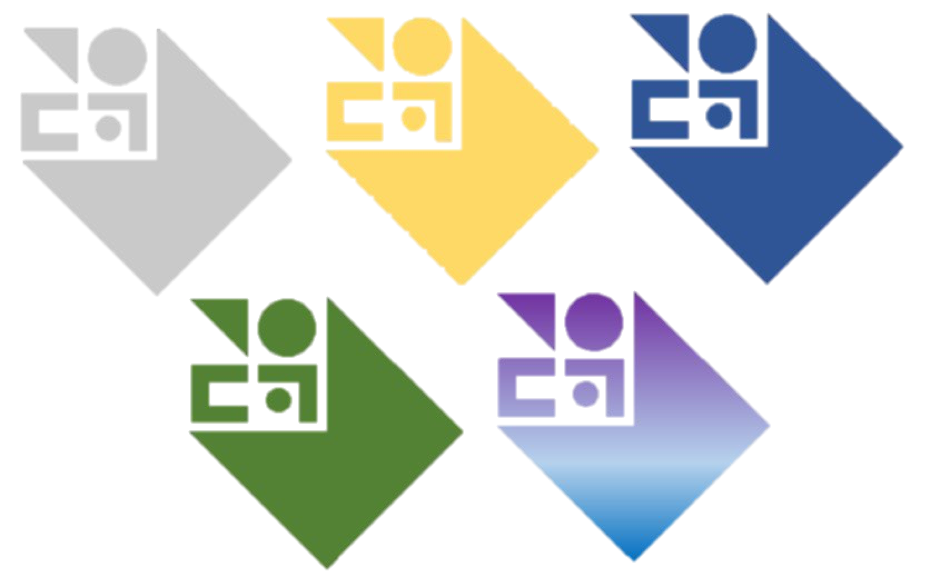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