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석사 과정
손의범
ubs5252@kaist.ac.kr
어느 날 극장을 나오면서. 작년 5월 디즈니의 실사 영화 <인어공주>(The Little Mermaid, 2023)를 보고 나오면서 스스로 질문했다. 관객들이 만 오천 원짜리 영화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한다고, 과도한 PC(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 강요가 불쾌하다는 상투적인 욕을 한다고, 그래서 그런 분개가 옹졸하다며 비슷하리만치 상투적으로 분개한다면 괜찮겠는가. 정정당당한 반항인가. 영화 초반 선원들이 돌고래를 인어로 착각해 사냥하는 장면으로부터 나 또한 공격적인 사람들이 작품을 깍둑써는 구도를 연상하고 씁쓸해하긴 했다. 무분별한 비난을 비판하는 이들의 심정에도 일정 부분 공감했다.1 그러나 나는 한때 뜨거운 감자였던 <인어공주>가 끝내 어린 시절 찐 감자의 따뜻한 추억을 해쳐버린 신호등 감자쯤으로 취급받게 된 현실을 잘 알고 있다. 무려 디즈니 100주년 기념 영화였던 <위시>(Wish, 2023)마저 흥행에 실패하면서, CEO가 ‘메시지 중심의 기조’를 바꾸겠다고 인터뷰하면서,2 다채로운 신호등 감자를 지지하던 사람들은 목소리든 힘이든 하여간 잃어버렸다. 혹은 디즈니라는 배를 이미 버렸다.
나는 현실 식재료의 맛을 잘 느끼지 못해 물오른 제철 생선은 구태여 찾지 않으나, 영화만큼은 철 지나 식어버려도 석연찮으면 다시 찾는다. 돌이켜보면 <인어공주>는 하나의 요리로서 비평의 대상이 되는 대신 왜 뜨거워졌는지에 관해서만 주로 논의되었다. 신랄하게 평가받은 것은 영화가 아니라 일반 대중과 그들의 미감이었다. 그런데 대중은 누구이며 미감은 어디에 있는가. 미감이란 자극과 반응 이상의 미묘한 무언가일 테지만, 관객이 국밥 한 그릇 이상의 금액을 지불하면 관성처럼 미각이 전면에 나선다. “우린 그런 걸 돈 주고 보잖아요.”3 과연 영화관이란 처음 방문하는 식당과 별반 다르지 않다. 오늘의 시청각적 식사는 건강하면서도, 색다르면서도, 예상과 기대를 너무 벗어나지는 말아야 한다. 각기 다른 취향의 손님들은 맛집 리뷰를 남길 때보다도 박하게 별점을 매긴다. 호오 이상의 반영을 결여한 만족도 점수가 평균치로 압축되어 디지털 세계를 표류한다. 다방면에서 완벽한 요리를 요구하는 듯 보였던 대중은 진작 신기루처럼 흩어졌으니, 이것이 우리 논의가 대상을 잃게 된 사유다.
방황을 멈추려면 일의 순서부터 되돌려야 한다. 나홍진 감독의 9분짜리 단편 <완벽한 도미 요리>(2005)가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영화는 ‘완벽한 도미 요리’라는 주문서를 받아 든 요리사가 심혈을 기울여 요리를 완성하려는 과정을 짧고 리드미컬하게 표현한다. 과학적 계량에 자해까지 동반한 조리를 얼마나 오래 진행했는지, 서빙을 기다리던 손님은 음식이 나올 때 이미 죽어 백골이 되었다. 놀랍지 않게도 우리는 왜 요리사에게 ‘완벽한 도미 요리’라는 주문이 들어왔으며 왜 요리사가 그것을 받아야 하는지 등의 설정은 문제 삼지 않는다. 넓게는 창작자, 좁게는 감독을 요리사로 은유했음을 곧바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관찰은 간단한 사실을 일깨워준다: ‘작품은 창작자의 욕망을 양분으로 삼아 탄생했다.’ 그것이 어떻게 설계되었을지 살피는 노력이 대중과 사회에 대한 판단보다 앞서야 한다는 뜻이다.


<그림 1> 영화 <인어공주> 프로듀서 존 델루카(John DeLuca), 촬영 감독 디온 비비(Dion Beebe), 감독 롭 마샬(Rob Marshall). 자일스 키트(Giles Keyte) 촬영. Copyright 2023. Disney Enterprises, Inc. All Rights Reserved.4 (왼쪽)
<그림 2> 영화 <완벽한 도미요리> 中5 (오른쪽)
그렇다면 이 글은 때아닌 <인어공주> 비평으로 그칠 것인가. 나는 <인어공주>를 분해하고, 변호하고, 비판하기 위해 전반부에 상당한 분량을 투자한다. 그러나 약속하건대『과학뒤켠』 16호 ‘도마 위의 <인어공주> 리뷰’는 예상과 기대를 벗어나 전혀 엉뚱한 곳으로 향한다. 이 글은 비록 실패한 영화를 해체하면서 출발하지만 문화, 정의, 나아가 우리의 관점까지 도마 위에 올려놓는다. 무엇이 어떤 면에서 문제적인가? 우리는 <인어공주> 논쟁을 다르게 받아들일 만한가? 다다른 결론이 적절할지는 조심스럽고 의심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쯤 비켜선 반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나도 여러분도 시작하는 것이다. 자유의 과잉을, 혼돈을 시작하는 것이다. 모깃소리보다도 더 작은 목소리로 시작하는 것이다.”6 나는 도마 위에 걸터앉아 모깃소리보다도 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릴 것이다. ‘BTS, 봉준호, 림 킴(Lim Kim), 니퉁.’
1. 외모를 배제한 끌림으로의 전환
제작을 마친 영화의 본래 의도는 영영 알 수 없어 파악한 의도로 재구성되는 법이다. 다만 다음 두 가지 단순한 지향점은 디즈니의 본래 의도로 공인받은 듯하다: (A) 실사화를 통한 수익 창출, (B) 인종 다양성 추구. 그렇기 때문에 ‘주연 배우 인종을 변경하면서 실사화로 흥행을 노렸다’는 지극히 직관적인 비난을 직면한 셈이다. 나는 이 절반의 사실이 단순하더라도 무리하게 부정하는 대신, 놓쳤을 법한 나머지 절반의 목적을 마저 밝혀내고자 한다. 그 중 하나는 (C) 외모를 배제한 끌림으로의 전환이다.
먼저 1989년 애니메이션 인어공주, 폭죽 빛에 이끌려 수면으로 올라간 인어공주 에리얼이 갑판을 훔쳐본다. 개 맥스가 에리얼의 냄새를 맡고 다가오지만 이내 왕자의 부름을 받고 되돌아간다. 에리얼의 시점 쇼트는 맥스에서 에릭 왕자로 옮겨간 후 줌 인 한다. 이때 에리얼은 에릭을 보고 말 그대로 ‘놀란다.’ 애니메이션은 에릭 왕자의 얼굴을 더 확대하고, 에리얼의 감정에 주목하라는 듯 그녀의 놀란 표정을 클로즈업해 이어 붙인다. 에리얼은 벌써 사랑에 빠진 얼굴로 미소 짓는다. 그러고는 갈매기 스커틀에게 속삭인다: “너무 잘생기지 않았어?” 이후 갑작스러운 폭풍우로 배가 암초와 충돌하고 에리얼은 그를 구해 해변으로 데려간다. 해가 떠오를 즈음 에리얼은 태양 빛을 후광 삼아 노래한다. 깨어난 에릭은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의 여인이 자신을 구해줬다고 말한다. 시간이 흐른 뒤 그는 다리를 얻은 에리얼을 발견하는데 어쩐지 낯이 익다. “어디선가 본 듯한데요.” 그는 드레스로 갈아입은 에리얼을 보고 마찬가지로 ‘놀란다.’ “정말 아름답군요.” 식사 장면에선 에리얼에게 푹 빠져 집사의 말을 놓치기까지 한다.
요컨대 에리얼과 에릭은 서로의 겉모습이 아름다워 끌렸다. 연출이 본능적인 이끌림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에리얼이 인간 세상을 동경했고 에릭이 생명의 은인을 찾아다녔다는 설정은 부차적이게 된다. 그 결과 마녀 우르슐라가 Poor Unfortunate Souls 중 ‘네 외모가 있잖아’라며 예쁜 얼굴은 통하게 되어있다고 에리얼을 안심시킨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진실로서 살아남는다. 목소리의 상실은 희극적 장치로 전락하고, ‘남자들은 말 많은 여자를 지루해한다’는 속삭임은 어쩐지 해명되지 않는다.
반면 실사 영화는 두 캐릭터가 설득력 있게 맞물리도록 배경을 구체화한다. 새로운 인물 셀리나 여왕을 지상에 추가하고 에릭이 과거 입양되었다는 설정을 집어넣은 게 결정적이다. 두 세계의 자녀들은 부모가 강제하는 기존 세계에서 벗어나 자신을 확장하고자 하는 열망을 갖는다. 특기할 만한 점으로 각각 이성 부모만 남겨놓아서, 부모들의 기대는 마치 자녀들이 도전을 그만두고 ‘바람직하게’ 성장하여 한쪽의 부재를 해결하게끔 압박하는 듯하다. 더 이상 행동의 이유는 호기심과 모험심 정도로 간단히 정리되지 않는다. 실사 영화의 에리얼은 지상 세계를 궁금해하는 애니메이션 소녀보다 훨씬 간절하게 연기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두 작품의 메인 넘버 Part of your world 간 에리얼의 표정·감정 묘사가 확연히 차이 남을 느낄 수 있다.
각색 의도에 맞게 에리얼을 향한 우르슐라의 외모 칭찬이 삭제되며 에리얼도 에릭의 얼굴에 먼저 매료되지 않는다. 실사 영화는 갑판에서 에리얼이 에릭의 얼굴을 보고 놀라도록 연출하는 대신 당분간 에릭의 얼굴이 에리얼의 시점 쇼트에 들어오지 않도록 의도한다. 집사는 성인이 되었으니 소임을 다하라고 조언하지만, 에릭은 양아버지와는 다른 왕이 되겠다며 외부 세상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지를 내비친다. 무언가 느낀 듯한 에리얼의 표정이 클로즈업된다. 에리얼이 에릭의 얼굴을 확인하는 건 그다음 컷이다. 아버지 트라이튼과 갈등했던 에리얼은 처음 본 인간에게서 자신과 같은 열망을 확인해 이끌리게끔 수정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에릭은 은인의 목소리와 실루엣만을 어렴풋이 기억하므로, 눈앞에서 코르셋을 조인 채 침묵하는 에리얼에겐 반하지 않는다. 실사 영화는 새로운 공간을 추가해 에릭 또한 자신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특별한 사람으로 에리얼을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그림 3>).

실사 영화의 (C) 외모를 배제한 끌림으로의 전환은 기존 감정선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디즈니 공주 에리얼의 차별점과 정체성을 아름다운 얼굴이 아닌 아름다운 목소리로 재해석한다. 자연스럽게 캐릭터의 뿌리인 세이렌 신화가 떠오를 만하다. 인어가 선원을 매혹해 죽게 만든다는 전설은 작중 두 세력 간의 불화 요소다. 그런데 목소리로 마법을 거는 캐릭터는 인어가 아니라 우르슐라였으며, 영화는 우르슐라를 인간과 인어 사이에 분란을 일으키는 존재로 설명한다. 세이렌 신화가 과거 남성 선원들의 시점에서 만들어진 전형적인 악녀 이야기인 점을 고려하면 구도를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에리얼의 아름다운 목소리는 오해와 달리 그저 아름다울 따름이므로, 오해를 풀고 두 세계를 화해시키는 건 그녀에게 있어 숙명이다. 공주는 목소리를 되찾으면서 다음 세대에 화합을 불러올 테니 그것이 곧 목소리의 힘이다. 이렇듯 디즈니는 ‘공주 주체성 강조’라는 지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인어공주>를 처음부터 끝까지 목소리에 대한 이야기로 일관되게 정돈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2. 원래 있던 곳에 돌려놓기
‘왜 리메이크 인어공주는 흑인이어야 했는가?’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오답은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단계, 오로지 직관에 의존해 질문이 중요하지 않다고 기각하는 것. 비난의 공간을 무한정 열어주는 가장 유해한 기만이다. 2단계, 흑인 캐스팅을 (B) 인종 다양성 추구로만 설명하려는 시도. 이런 식의 해명은 디즈니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주연 배역에 블랙워싱(blackwashing)을 수행했다는 불만을 불가분의 대립 쌍으로 허용하고 만다. 3단계, 산호초가 가득한 실제 환경을 찾아 발트해에서 카리브해로 장소 변경을 했기 때문이라는 주장. 이 주장은 대서양으로, 지중해로, 홍해로 떠돌다가 끝내 다중적 진실로 남은 디즈니 인어공주의 배경을 단 하나로 확정한다는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8 아틀란티카는 어디까지나 가상의 도시인데, 가사 내용과 건축양식 등 수많은 단서 중에 어떻게 오직 산호초만이 스모킹 건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각 단계의 불완전한 설득은 먹혀들지 않는 경우 이전 단계로 회귀하다 ‘왜 그것이 중요하냐’는 어설픈 되물음만 남긴다.
나는 또 다른 의도를 추정해 돌파구를 만들고자 한다. 바로 (D) ‘원래 있던 곳에 돌려놓기’다. 문화의 주인을 묻고, 마치 출처를 표기하듯 사용한 문화나 자연경관을 원래 있던 곳에 돌려놓는 것은 물론 올바름의 영역이다. 제자리에 돌려 놓는 교정 행위는 예술적 관점에서 이유 없더라도 역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작품 외적인 가치를 형성한다. 이때 외적인 가치에 다다르고자 한 내적 시도는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다. 흔히 지적하듯 흑인 캐스팅 자체는 (B) 인종 다양성 추구에 근거한 컬러 블라인드 캐스팅의 결과일 뿐 그것만으로 예술적이라기엔 어폐가 있다.9 그래서 나는 캐스팅이 어떻게 작품 방향을 결정해 완성하는지, 왜 카리브해가 <인어공주>를 가장 강하게 끌어당기는지 설명하려는 것이다.
인어공주의 대표곡 Under the sea는 어디에서 왔을까? 작곡가 앨런 멩컨(Alan Menken)의 머릿속에서 이토록 아름다운 음악이 자연발생 했다고는 주장할 수 없다. 이 곡의 장르는 칼립소(calypso)로 카리브해 트리니다드 토바고를 기원으로 한다. 칼립소의 기본 요소는 크게 3가지로 정리된다.10 첫째는 리듬, 그것은 레게(reggae)에 속하는 현시대 스카(ska)와 닮았다. 네 박자를 기본으로 두 마디를 반복하되 정박을 당기는 싱코페이션이 사용된다. 둘째, 본래 노동요였기 때문에 여타 민요와 같이 메기고 받는 구조다. 셋째, 멜로디 악기 스틸팬(steelpan)의 사용이다(<그림 4>). 우리가 Under the sea를 상상할 때 즉각 떠오르는 맑고 신비한 음색이 바로 스틸팬 소리다.

녹음된 칼립소 음악은 Lovey’s String Band의 1912년이 최초다.12 칼립소는 카리브해 국가들 사이에서 퍼지며 다양한 하위 장르를 생성했는데, 미국으로 건너가 유행하기 시작한 건 1956년 해리 벨라폰테(Harry Belafonte)의 앨범 <Calypso>와 수록곡 Day-O (Banana Boat Song)의 메가 히트가 상징적 기점으로 꼽힌다. 해리 벨라폰테 자신이 자메이카 출신이었고, 앨범도 이름과 달리 분류상 멘토(mento)에 가까웠지만, 이듬해 뮤지컬 <Jamaica>(1957)의 Leave de Atom Alone까지 놓고 보면 적어도 미국에 카리브해 음악 열풍이 불어닥친 것은 확인 가능하다. 아직 스틸팬 대신 브라스를 사용하지만 말이다. 흥행한 칼립소 음악이라고 불릴만한 곡은 1971년 The Esso Trinidad Steel Band의 I Want You Back으로 비로소 스틸팬을 전면에 내세운다.



<그림 5> QR코드, 좌측부터 순서대로 Day-O (Banana Boat Song)13, I Want You Back14, Bacchanal Lady(1987).15
칼립소가 점차 대중화되어 우리에게 익숙한 스타일을 구축하는 시점은 1970년대 후반으로, 소울 칼립소(soul of calypso, soca)라는 장르가 등장해 인기를 얻고 그것이 정통 칼립소의 계승이라는 인식이 만들어지면서다.16 마침내 1980년대 후반 데이비드 러더(David Rudder)의 Dedication (A praise song) 혹은 Bacchanal Lady에 이르면 Under the sea와 굉장히 유사하게 들린다. 이런 흐름 속에서 1989년 개봉한 애니메이션 인어공주는 칼립소 음악을 덮어씌움으로써 손쉽게 이국적인 분위기를 구현한 것이었다.17 그러자 애석하게도 칼립소라는 장르가 가진 역사적 맥락은 쉽게 도려낼 수 있게 됐다. 식민지 탄압에 저항하는 카니발 축제에서 북 연주가 제한되어 철제 그릇을 두드린 게 스틸팬이 되었다든지 등의 기록은 음악의 히트에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18
Under the sea는 바닷속 세상을 예찬할 뿐이지만 본래 칼립소는 노랫말에도 저항을 담아왔다.19 그러다 보니 미국인이 서구 비판적인 가사를 ‘순화시켜’ 곡을 표절한 사례가 있기도 했다. 1943년 로드 인베이더(Lord Invader)라는 예명의 트리니다드 토바고 음악인은 민요 기반 멜로디에 가사를 붙인 Rum and Coca-Cola의 저작권을 얻어 놓은 상태였다. 그런데 미국인 모리 암스테르담(Morey Amsterdam)은 이 노래를 현지에서 듣고 미국으로 돌아가 1944년 앤드루스 시스터즈(The Andrews Sisters)를 가수로 Rum and Coca-Cola를 따로 발매해 버린다.20 주목해야 할 점, 원가사의 경우 미군이 트리니다드 토바고 여성들에게 친절히 큰돈을 쥐여준다며 매춘을 암시하고 이를 비꼬는 반면, 모리 암스테르담의 버전은 ‘And they give them a better price’를 ‘Make Trinidad like paradise’로 바꿔 무해하고 긍정적인 뉘앙스로 뒤집는다.
이 사건은 저작권 침해 판결과 손해배상으로 귀결되었지만 여전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 내가 지적하는 것은 문화 전유(cultural appropriation)로, 한 문화 집단이 다른 문화 집단의 창의적이거나 예술적인 형식, 주제 또는 관습을 유용하려는 시도다.21 단순히 칼립소라는 선택을 문제 삼는 게 아니다. 그동안 디즈니는 “역사 사회적 구성 요소를 배제함으로써 사회의 문제점이나 갈등에서 벗어난 비일상적이며 비역사적이며 비정치적이며 비논리적인 공간을 어린이들에게 순수함이라는 개념으로 제공”해왔다.22 <라이온 킹>(The Lion King, 1994)에서 하이에나들은 도시 흑인 또는 스페인계 억양을 사용하고 주연들은 표준 억양을 사용하는 것, <알라딘>(Aladdin, 1992)의 ‘나쁜’ 아랍인들과 달리 주인공 알라딘은 톰 크루즈를 모델로 그려져 역시 표준 억양을 사용하는 것 등의 문제들은 ‘애니메이션 속 가상 세계’라는 변명으로 늘 은폐되어 온 게 사실이다.23 비록 흑인 억양이란 지나치게 투박한 분류법이겠으나, 애니메이션 인어공주에서 흑인 가수 새뮤얼 E. 라이트(Samuel E. Wright)는 궁정 작곡가 세바스찬의 목소리를 맡아 Under the Sea의 특색을 잘 살려냈다. 그가 녹음한 Kiss the Girl도 레게 음악으로 카리브해 섬나라 자메이카에서 유래했다. 그러나 우리는 정작 주연 인어공주가 흰 피부로 동떨어진 데에는 이미 둔감한 것이다. 현대에 이르러 작품의 배경과 주인공의 인종을 돌려놓겠다니 장난감이나 옷을 비롯한 굿즈들과 테마파크가 모든 것의 본 주인인 양 반발하는데, 이것이 문화 전유의 살아있는 예시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인어공주의 이름 에리얼(Ariel)의 기원 또한 따져볼 만하다. 의외로 안데르센 원작 동화에서 에리얼이라는 이름은 언급되지 않는다. 다만 1836년 원작 집필 당시 가제가 ‘공기의 딸들’이었으며, 17세기 셰익스피어 희곡 『템페스트』(The Tempest) 속 공기의 정령 이름이 바로 에리얼이라는 점에서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다. 『템페스트』는 밀라노 대공 지위를 빼앗기고 외딴섬에 도착한 주인공 푸러스퍼로가 섬을 지배하던 마녀를 처치한 후 마법과 폭풍을 다뤄 자신의 지위를 되찾는 이야기다. 작중 정령 에리얼은 푸러스퍼로에 의해 해방된 다음 그를 주인으로 섬기는, 충직하게 은혜를 갚는 선한 영혼을 상징한다. 자신의 사랑마저 포기하고 이타심을 발휘하는 소설 인어공주에게 안데르센이 명시하지 않은 이름 에리얼을 디즈니가 되돌린 데에는 납득이 가는 구석이 있다.
하지만 『템페스트』가 에리얼에게 선하고 순수한 캐릭터성을 부여한 방법은 그다지 선하고 순수하지 않았다. 섬 원주민 캘러밴을 대척점에 세우고 푸러스퍼로가 그를 노예로 부리도록 설정했기 때문이다. 원주민이 ‘영혼 없는 육신’쯤으로 격하되는 한편, 푸러스퍼로는 ‘선한 영혼’의 도움을 받으면서 소위 비문명화된 인간을 계몽하는 듯 착취한다. 다시 말해 에리얼의 순수성은 대조를 이루는 캘러밴에게 빚을 진다. 그도 그럴 것이 『템페스트』는 셰익스피어가 집필할 무렵 어느 영국인이 버뮤다 군도에 난파된 기록, 그리고 식민지 개척자들이 인디언에 의해 겪은 위험을 토대로 탄생했다고 전해진다.24 섬 정복이라는 소재로 제국주의적 시각을 유감없이 드러낸 『템페스트』는 후대의 비판을 직면해야 했다. 일례로 소설 『어떤 태풍』(Une Tempête)은 『템페스트』의 전복적 각색을 의도해 노예 캘러밴을 중심으로 극을 풀어낸다.25 저자 에메 세제르가 카리브해의 조그만 섬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은 인어공주를 역사적 문제의식으로부터 도망치지 못하게 한다.
이상으로 살펴본바 인어공주는 지구상에 위치하려거든 그 구성요소가 기원한 카리브해로 불러들여진다. 마침 실사 영화 제작진이 촬영 장소는 달리하더라도 배경은 카리브해로 설정하고자 했고,26 더군다나 배우의 인종이 지리적 배경에 어느 정도 맞춰지므로, 디즈니의 결정은 문화 전유에 대한 거대 기업의 반성이라 평가 가능해진다. 나는 이렇게 블랙워싱 프레임에서 벗어나 흑인 배우 출연을 예술적 관점으로 해석할 것을 제안한다. 주연 배우가 자신의 드레드록스 머리를 고수하려는 의지에 제작진이 굳이 호응한 것도, 과거 애니메이션을 그대로 재현하기보다 해당 지역에서 비롯한 헤어스타일을 존중하고 뚜렷이 드러낸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다.
3. 디즈니는 정말 돌려놓았는가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인어공주>는 공주의 목소리에 주안점을 두어 기존 애니메이션이 충실하지 않았던 외모 이상의 감정선을 보완하고, 디즈니 제국이 상업적 성공을 위해 전유한 타국의 문화와 자연경관을 재위치 시키며, 세계 바깥을 악으로 규정하고 두려워하던 과거 세대를 넘어선다는 메시지를 ‘새 시대의 다양성 추구 (트라이튼의 딸들이 7대양에서 온다는 등의 설정이 여기 포함된다)’와 연결 짓는 동시에 발전된 기술력을 동원해 매력적인 실사 영화로 개봉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이었다.
이는 설계 의도를 최대한 선해하여 도출한 가설이지만서도 흔히 가해지는 부정적 평가와 별달리 상충하지 않는다. 말마따나 일부 장면에서 배우의 행동은 주어진 상황과 조화롭지 못해 연기 디렉팅에 실패한 듯 보인다. 새로 추가된 넘버들은 상대적으로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다. 수중 촬영의 완성도는 조명을 관리할 필요가 없는 애니메이션과 직접 비교하긴 어렵더라도 아쉽게 느낄 만하다. 이런 류의 부족함은 인정해도 무방한 축에 속할 것이다. 다만 한 가지 특별히 뼈아픈 지적을 꼽으면, 왜 주연배우 인종을 바꾸면서 ‘외모에 이끌리지 않도록’ 연출했냐는 질문이다. (B) 인종 다양성 추구와 (C) 외모를 배제한 끌림으로의 전환은 독립적으로 지향되었더라도 합쳐져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우르슐라의 인간 모습으로 캐스팅한 제시카 알렉산더(Jessica Alexander)가 인어공주 역 할리 베일리(Halle Bailey)와 닮지 않고 오히려 대중이 관습적으로 인어공주에 기대하는 피부색인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가중시켰다. 여기에 기존 팬덤을 배려하지 않은 공식 입장,27 어린이 관객을 배려하지 않은 점프 스케어 등은 중대한 결함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으나 어느 정도 불만을 자초했다고 채점해야 한다. 소통의 실패 내지는 잘못 디자인한 마케팅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물음이 남아있다: ‘디즈니는 정말 돌려놓았는가?’ 우리는 기업이 내세운 올바름 추구의 진정성을 불신하고 거짓말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목적 (B), (C), (D)가 번지르르해도 실은 수익 창출에 필요한 마케팅 아이템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언뜻 가능해 보인다. 이런 식의 문제 제기는 여러 예술 분야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되기도 한다. 그러나 ‘돈을 번다면 그저 돈을 벌기 위함일 뿐’이라는 원천 봉쇄의 오류를 벗어나지 못한다. 상업성 비판은 첫째, 백 퍼센트 순수한 예술만을 옹호하고 긍정하거나, 둘째, 예술품 그 자체의 미적 가치만 인정하면서도 절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믿는다. 무엇보다도 셋째, 비판하는 사람이 그 대상을 자의적으로 설정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다. 달리 말해 상업성 비판은 수익을 창출하는 모든 영화에 적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중 일부만 표적으로 삼는다. 이 지점을 정확히 찌르면서 놀라운 대칭 구조를 구현한 영화로 지난해 <바비> (Barbie, 2023)가 있었다. <바비>는 ‘상업적 가치를 빌미로 창작물의 나머지 가치를 폄하하는 것은 대중과 사회가 부당하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바비 인형을 지지하고, 영화 자신도 기록적인 흥행을 끌어내면서 상업적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을 난처하게 만든다. 이 영화는 재차 언급되겠지만, 적어도 지금 문단에서는 진정성 논의가 쉽게 빠질법한 함정을 환기하고 있다.
그 점에 유의하며 Under the sea를 재검토해 본다. 애니메이션 인어공주에 삽입된 Under the sea의 경우 앞서 언급한 칼립소 리듬과 스틸팬 연주를 충실히 활용했다. 새뮤얼 E. 라이트가 ‘Under the sea’라고 맛깔나게 소리 내자 여러 명의 코러스가 빠르게 ‘Under the sea’라고 덧붙이는 메기고 받기 형식을 따른다. 한편 실사 영화의 Under the sea는 노골적으로 서구 오케스트라 편곡을 추가하면서 칼립소 전통보다는 뮤지컬에 훨씬 가까워졌다. 그렇다면 영화 배경을 카리브해로 돌려놓겠다는 기존 가설은 도전받게 되는가.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소속 연주자 백여 명이 칼립소에 개입하는 순간,28 풍성한 악기 구성이 가지각색의 바다생물을 잘 꾸며주더라도 디즈니는 전유를 반성한다며 새로 전유한 꼴이 되고 마는가. 우리는 자연히 묻게 된다: ‘진정성은 어떻게 판정할 수 있나?’
음악이야말로 경계를 넘어서기에 가장 좋은 문화 형태인 만큼 판정 기준은 모호할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뮬란> (Mulan, 1998)의 I’ll Make a Man Out of You는 대중이 동양에 대해 가질법한 음악적 이미지를 재현하는 듯 가사 첫 줄 ‘Let’s get down to business’까지는 5음계만으로 멜로디를 구성한다. 그런데 다음 가사 ‘To defeat the Huns’ 중 ‘-feat’에 이르면 잠시 5음계를 탈출하고, 가면 갈수록 12음계로 움직인다.29 반복 구간의 최초 여덟 음절가량을 5음계로 구성해 동양스럽고 이국적인 매력을 확보한 것이다. 그것은 공교롭게도 흔히 오리엔탈 리프(oriental riff) 혹은 아시안 리프(Asian riff)라고 불리는 것,30 칼 더글라스(Carl Douglas)의 Kung Fu Fighting을 꾸며주는 그 유명한 멜로디와 강박에서 음정이 일치한다. 하지만 이런 공교로움과는 별개로 주인공 뮬란의 불굴을 벅차오르게 표현하기 때문에 성공한 융합이자 예술적 성취로 다가오는 게 사실이다. 서구의 음악 형식을 개입시켜 친숙하게 만드는 것을 장르 서구화 전략이라고 이름 붙일 순 있겠다. 그렇다 한들 뮤지컬과 비서구 음악의 조화를 모두 문화 전유로 봐야 하는지는 다소 의문스럽다는 이야기다.
그런고로 음악적 시도는 제약 없이 완전히 자유롭게 허용될 만하다. 이 입장은 윤리적 후퇴가 아니다. 완전히 자유로운 와중에 어떤 음악을 의도했는지가 곧 윤리성을 설명할 것이기 때문이다.31 사이먼 프리스(Simon Frith)의 이러한 관점을 진정성 논의에 적용한다면, 결과물을 대상으로 한 기계적 분류보다는 제작 과정에서 기원을 얼마나 존중해 반영했는지 들여다보는 게 중요해진다. 이때 존중이란 어떤 집단이 그 문화를 대표할 수 있을지, 대표하는 방식을 그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할지 등을 고려하며 점차 구성된다. 최근 모범적인 예시로 북미에서 2월 개봉한 <밥 말리: 원 러브>(Bob Marley: One Love, 2024)는 편곡 및 창법 가이드 등 대부분의 작업에 밥 말리와 유관한 인물들을 다수 섭외했다.32 그저 실존 인물의 재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기에는 상당한 수준의 소통을 이어나간 결과 ‘자메이카인이 밥 말리 역으로 캐스팅되지 않았다’는 비판마저 이겨낼 만큼 정당한 성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이 경우 할리우드가 밥 말리의 이미지와 레게 정신을 일방적으로 전유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다시, 디즈니는 정말 인어공주를 카리브해로 돌려놓았는가? 불행히도 나는 작곡가 앨런 맹컨과 카리브해 사이의 어떠한 연관성도 포착하지 못했다. 호의적인 기존 가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Under the sea의 편곡 의도가 실사 영화의 제작 의도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했으나, 그가 편곡을 위해 카리브해 혹은 칼립소 음악가들과 교류했다는 기록은 전혀 찾을 수 없었다. 조사가 미진했을 가능성은 열어두지만, 최종적으로 한 가지 비판을 남길 수밖에 없다: “디즈니는 충분히 돌려놓지 않았고, 내려놓지 않았다.” 그들의 불완전한 인어요리는 진정성을 충분히 함유하지 못한 탓에 혹평 대부분을 받아들일 운명에 처했다.
4. 반성적 문화를 선진적이라 여기는 인식
여기까지 나는 <인어공주> 해석을 나 자신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하고자 노력했다. 다시 말해 이 글은 내가 아닌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쓸 수 있는 글처럼 작성되었다. 되도록 주관보다는 객관을, 개인으로서 어떻게 느꼈는지 서술하기보다는 어떤 재료가 요리에 쓰였는지 논하려 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영화란 초당 스물네 장의 이미지 평면 정도로 환원되지 않는 법이다. 쓰는 이의 관점을 숨기기 위해 보편타당한 물리적 속성만을 열거하는 건 한계가 있으며, 기필코 그것만을 열거하겠다는 선택마저 모아놓고 보면 하나의 주관이 된다.
‘도마 위의 <인어공주> 리뷰’는 결국 작성자가 도마 위에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왜 당신은 하필이면 <인어공주>를 골라 글을 쓰는가’, ‘왜 당신은 인어공주 이야기를 굳이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가’ 등의 질문은 우주적 우연쯤으로 받아칠 수 없다. 우연으로 받아친다면 그만큼 비례하여 무책임해진다. 마치 <완벽한 도미 요리> 중 도미의 눈이 짓이겨지자 요리사가 자신의 한쪽 눈을 뽑아 대신 끼워 넣듯, 결과물이 드러내는 관점이란 아무리 부정하려 들어도 창작자의 관점이 반영되었다고 의심받을 만하다. 그리하여 <인어공주>를 설명하는 매 순간 내 관점 또한 도마 위로 끌려간다. 『과학뒤켠』의 기고자이자 편집장이기 이전에 한 명의 인간으로서 나는 과거 경험과 소속된 사회에 묶인다. 나는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이라는 환경에서 사회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다양성의 가치를 공기처럼 느껴 <인어공주>를 선해해보기로 결심했을 수 있다. 한편으로는 그간의 취미 활동 덕분에 영화와 음악을 애정하게 되었으니 가설에서 비롯한 디즈니의 진정성도 면밀히 검토하게 되었을 테다. 글 쓰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놓인 도마를 알아차리는 건 필연적이다.
그런데 내게 <인어공주>는 꼭 호의적으로 해석되어야만 하는가? 나는 한국어 자막이 달린 <인어공주>를 관람했고, 영화를 리뷰하는 여러 한국 유튜브 영상을 보았으며, 디즈니의 PC 지향을 비토하는 여론을 감각할 수 있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대중이 <인어공주>를 위선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경향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 거대 기업의 반성은 어디까지나 가설에 불과하고, 피상적으로 본다면 <인어공주>는 ‘주연 배우 인종을 변경하면서 실사화로 흥행을 노렸을 뿐’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처럼 ‘할로윈에 타민족 전통 의상을 입어도 되는지’ 고민하지 않으니 문화 전유라는 개념도 일상과 멀리 떨어져 있다.34 나조차도 이 글을 작성하기 전에는 카리브해에 얽힌 역사와 문화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다. 그런데도 학문과 가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어공주>를 선택해 깊이 들여다보았다는 사실, 공들여 해석하지 않았더라면 <인어공주>를 편협한 대중이 깎아내린 비운의 작품 정도로 추억했을지 모른다는 사실이 나는 가장 찝찝한 것이다.
따라서 나는 내가 위치하면서도 배제해 버린 ‘한국’이라는 도마를 의식하고 이렇게 도발한다: ‘인종주의에 대한 반성적 문화를 선진적이라 여기는 인식이야말로 서구로부터 주입된 것이 아닌가?’
혹자는 그러한 인식이 순전히 한국적 경험에서 비롯했을 가능성을 제기할지 모른다. 예를 들어 한국은 단일민족이라는 개념 아래 국가를 유지해 왔으나 블랙페이스에 대해서는 종종 교정이 있었다. 과거 KBS <쇼 비디오 자키>의 코너 ‘시커먼스’는 88올림픽 직전 흑인 비하를 우려해 폐지되었다고 전해진다.35 기사에 따르면 “세계 각지에서 흑인들이 올 텐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였는데, 이것은 서구가 제시하는 행동 규범에 맞추었다기보다는 해당 인종의 관점을 고려했다고 봐야 한다. 관성을 회의함으로써 인식은 앞으로 나아가며 문화로 전승된다. 최소한 한국의 공영방송은 블랙페이스를 당당하게 되풀이하진 못할 것이다.36 그렇지만 ‘주연 배우 인종을 변경하면서 실사화로 흥행을 노린 듯 보이는’ 미국 기업을 선진적이라 여기는 인식은 좌우간 한국적 경험으로 설명되지 못한다. 실은, 모든 인식을 한국적 경험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설명의 실패보다 더 위험하다. 탈제국주의·탈식민주의 학자들은 일찍이 서구의 대항마로 토종 이론이나 문화를 내세우는 분리주의적 접근에 대해 경고해 온 바 있다.37
그렇다면 더더욱 인종주의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주로 서구 열강이 아닌 식민지국의 탈제국주의·탈식민주의 학자들로부터 비롯했다고 항의할 만하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이름 붙은 문제의식의 발생 지역을 묻고 있지 않다. 초점은 ‘선진적’이라고 여기는 ‘문화 인식’에 있다. 문화의 선진과 후진을 판단하는 현시대 우리의 잠정적 기준이 서구가 아닌지 질문하는 것이다.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는 문화의 의미를 두 가지로 나눈다. 첫째는 “서술 방법, 의사 전달, 표상과 같은 관습적 실천”으로 사실상 집단이 공유하는 모든 것이다.38 학교와 수업은 문화인가, 말할 것도 없다. 칠판과 분필은 문화인가, 우리가 질문하고 재조명하는 순간 칠판과 분필조차도 문화로 올라설 것이다. 더욱 중요하게도 둘째, 문화는 “세련화와 고상화”를 의미하기도 한다.39 공유하는 모든 것 중 어떤 기준으로든 최고로 여겨지는 것은 문화에 저장된다. 즉, 관습적 실천에 대한 우열 인식조차도 문화에 반영되며 시간에 따라 변한다.
그리고 여기 <인어공주>가 중국에서 백래시 때문에 흥행에 실패했다는 영국 더 가디언즈 지의 기사가 있다.40 이제는 그것이 어떻게 영국인의 관점에서 백래시라고 규정될 수 있는지 의심스럽지 않은가? ‘황인으로부터 흑인을 구해내는 백인’ 구도가 문화 간섭을 정당화하고 있다. 우리는 흑인을 직접 지배한 적이 없음에도 서구에서 넘어온 부채 의식을 부드럽게 떠안고 그들의 교정 욕구에 호응한다. 백인의 문화를 선진적이라 여겨 동경하면서도, 그들이 ‘흑인을 해방하는 황인’을 바람직한 황인으로 여기니 그 역할만을 수행하고 만족한다. 이 표현은 나르시시즘적 동일시(narcissistic identification)에 대한 호미 바바(Homi Bhabha)의 설명을 그대로 빌려 대상만 바꾼 것이다.41
왜 서구의 역사적 과오와 반성은 온 인류의 관점에서 선진적이라 여겨져야 하는가, 동양은 언제까지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 아래 “서양인에 의해 주목받고, 재건되고, 나아가 구제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간주”되어야 하는가.42 그러나 나는 이 이상으로 도발을 이어나가지 않는다. 반성적 문화를 지지하는 심리에 그것이 선진적이라는 인식이 반영되는지 확인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어쩌면 <인어공주>에 대한 호의는 ‘비난 속 인종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이해하는 게 가장 정확할지 모른다. 연극과 뮤지컬 캐스팅에 이미 일반적인 DEI(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는 영화로 좀처럼 확산하지 못하는데, 배역에 대한 매체의 관점 차이도 주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포용성 자체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 그런 인종주의가 내재한 배타성은 거부감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세련화나 고상화마저도 <인어공주>와 관련한 일련의 논쟁과 무관하게 치부할 수 있다.
다만 별안간 주지하자면, 이 잡지는 여전히 『과학뒤켠』이다. ‘서구 주입설’ 혹은 ‘반성적 문화를 선진적이라 여기는 인식’이 도사리게 됨으로써 도발은 계획된 쓸모를 다했다. 나는 서두에서 밝혔듯이 문화, 정의, 나아가 우리의 관점까지 도마 위에 올려놓고 혼란의 원인을 지목할 참이다. 마침내 이 글도 “이제 온몸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순간에 와있다.”43
5. 기술과 국가적 정체성
기술 발전과 세계화가 문화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경계하는 건 새로운 문제의식이 아니다. 사이드는 1993년 저서에서 미디어가 “외국 문화를 특이하고 위협적인 것으로 표상하는 데 효과적”이라며 문화적 타자화의 기능을 짚는다.44 그가 보기에 TV·뉴스·방송은 미국에서 걸프전을 정당화할 만큼 위험한 기술 발전 산물이었다. 비슷한 시기 스튜어트 홀(Stuart Hall)은 세계화 시대에 국가적 정체성이 처한 상황을 세 가지 가능성으로 정리한다.45 하나, 국가적 정체성은 문화적 균질화와 ‘글로벌 포스트모던’의 성장으로 침식되고 있다. 둘, 국가적 혹은 지역적인 특정 정체성은 세계화에 대한 저항으로 강화되고 있다. 셋, 국가적 정체성은 쇠퇴하고 있지만 새로운 혼종적(hybridity) 정체성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야말로 30년이 지나도 유효한 구분이다.
그래도 침식, 강화, 혼종화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새 시대의 새 관찰이 허락된 듯하다. 바라보건대 유튜브·틱톡·인스타그램 시대의 사람들은 전혀 다른 기술 발전 산물에 둘러싸여 살아간다. 과거 저명한 학자들은 ‘정체성(identity)’이라는 개념의 출현을 설명하기 위해 역사를 되짚어야 했으나, 우리는 디지털 환경에서 그 불안하고 모호한 성질까지 진작 내면에 받아들인 모양이다. 다채로운 개인 앞에서 이제 국가적 정체성은 특별히 더 주목받아야 할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 변화는 문화에도 도래했다. 예를 들어, 영화 소비가 화면에 떠 있는 영상을 해치우는 과정으로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2020년대의 영화 소비문화는 1990년대의 그것과 확연히 다르다. 개봉일은 조금씩 엇갈리더라도 우리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가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지 미디어를 통해 전해 듣는다. 신작은 전국 멀티플렉스에 상영되며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에 평균 별점이 전파된다. 숫자들은 다시 국경을 초월한다. 문화적인 연결은 매우 자연스럽게, 전에 상상할 수 없던 속도와 범위로 이루어지는 중이다.
한편 영화평론가 홍수정은 자신의 글 <‘동시대 관객’이라는 감각의 상실>에서 이렇게 서술한다:
“지금 우리 시대에서 전 세계 관객들을 동시에 영화관에 불러낼 수 있는 영화는 손에 꼽는다. 그 가장 선두에 아마도 <아바타> 시리즈가 있을 것이다. (…) 이제 그것들의 의미는 단순히 히트를 노려 수익을 거둬들이는 상품에 머물지 않는다. 제작자들이 그런 생각으로 만들었다 해도 마찬가지다. 관객의 입장에서 이런 영화들은 동시대 관객성을 지키는, 전 세계 대중들을 상대로 우리가 같은 영화로 호흡하고 있음을 자각하게 만드는, 흔치 않은 작품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46
‘흔치 않다’는 진단은 조금 전 부드럽게 지나친 문단을 되돌아보게 한다. 표현하자면 상반된 두 흐름이 긴장 상태를 이루고 있었다. 개개인의 선호에 맞춘 서비스가 우리를 서로 엇갈리도록 내버려두는 반면, 세계화는 종종 비슷한 형태의 침식으로 우리를 연결해 낸다. 동시대 관객성은 유튜브와 OTT로 인해 취향이 분리되는 시대에서 실로 이질적인 경험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의 풍경이 그다지 모순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건, 우리가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강요받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 종류의 자기 인식은 당연히 동시에 갖는 것이 허용되며 ‘우리’ 안에서 서로 충돌하기보다 중첩된다.
이렇게 형성되는 새 시대 ‘다중 정체성’을 묘사하기 위해 나는 대명사 ‘우리’를 들여다본다. 지금껏 이 글은 대명사 ‘우리’의 국가적 정체성을 전제하고 한국인이라는 범주를 나타내는 데에 사용해 왔다. 우리가 주로 한국어를 사용하니 기본적으로 세상의 구도는 한국인 대 외국인으로 나눌 만했다. 그런데 디지털 시대에서 ‘우리’가 의미하는 범주란 상황에 따라 놀라울 정도로 변화무쌍한 것이다. 가령 우리는 유튜브 영문 영상을 누르는 순간까지 한국인이었다가 번역 버튼을 사용하면 세계인으로 거듭난다. 세계인으로서 무리 없이 마이클 잭슨(Michael Jackson)의 생전 모습을 그리워하고 정서를 나눌 수 있다. 하지만 오리엔탈리즘과 인종차별을 꼬집는 림 킴의 Yellow 뮤직비디오에 도착하면 ‘우리’는 아시아인이 된다.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다는 한국 언론 보도 영상을 접하면 ‘우리’는 한국인으로 돌아온다. 지금 나는 명시할 수 있는 지리적 범위만 조절하고 있지만, 종교나 기호 등 국가를 벗어난 구분을 모두 나열하자면 가히 글로 적을 수 없을 정도라는 건 명백하다. 현대에 이르러 정체성은 하나로 묶이는 대신 점점 더 파편화되고 있다.

<인어공주> 앞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스스로를 어떤 ‘우리’의 일부로 여기며, 그런 상상적 이미지에 어떻게 동일시하며 차별화하는가. 인간적인 감정과 가치를 공유하는 세계 시민으로 <인어공주>를 바라본다면 세계 시민으로서 응당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견지하려 들 수 있다. 그러나 영어권 일간지가 ‘동아시아 국가의 인종차별’로 <인어공주> 사례를 언급하면 우리는 기꺼이 동아시아인으로 물러설 만하다. 혹은 즐거운 추억을 간직한 개인으로 줄어든 다음 아무런 역사 인식 없이 소비할 수 있던 환상의 나라 디즈니를 돌려달라고 성토할지도 모른다. 반복하지만 이런 정체성은 개인 내에서 충돌하기보다 중첩된다. 우리는 세계적 기준부터 개인의 감상까지 온갖 관점을 자유롭게 뒤섞지만 종합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며, 논쟁은 어느 순간 대상은 물론이거니와 참여자의 뚜렷한 입장까지 잃어버린다. 요컨대 (1) <인어공주> 논쟁은 기술 발전이 국가적 정체성으로부터의 탈출을 촉진한 탓에 모호해졌다.
사람들을 묶어놓던 국가적 정체성이 개인과 세계 사이에서 주도권을 잃고 부유하는 건 분명 과거와 다른 모습이다. 이를테면 바바의 문화 혼종성 이론에는 그토록 중요한 국가적 정체성이 문화 상대주의, 분리주의, 민족주의 등으로 치닫지 않도록 경계했던 배경이 있다. ‘피식민 집단은 어떻게 나르시시즘적 동일시에 빠지지 않고 전복적 구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48 그가 주장하는 문화적 혼종성은 주류 문화를 모방해(mimicry) 필연적인 차이를 생성함으로써 지배 집단이 설정한 제국주의적 ‘우리’를 응시(gaze)하고 조롱한다.49 바꿔 말하면 ‘우리’가 생각만큼 쉽게 묶여 규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무기로 삼아 지배 집단을 위협한다.
“문제는 단순히 다른 국가들의 타자성에 대립되는 것으로서 국가의 ‘주체성’이 아니다. 우리가 대처해야 하는 것은 국민들의 이질성을 결합하면서 자기자신 내에서 분열되어 있는 네이션이다. 영속적인 자기발생으로부터 소원해져 있는, 가름대를 지닌 네이션(Nation) 그/자신은, 소수자들의 담론과 논쟁적인 민족들의 이질적인 역사, 그리고 갈등하는 권위들과 긴장된 문화적 차이의 이치들에 대해 ‘내부적으로’ 기입된, 한계적인(liminal) 의미작용의 공간이 된다”50
그런고로 바바는 세계 속 우리나라를 고민하기보다 국가를 문화가 교섭되는(negotiated) 장으로 바라보고 우리나라의 ‘우리’를 해체하고자 했다.51 이런 접근이 관념적 이론에 지나지 않는 듯 보인다면 새 시대에 이르러 국가적 정체성이 다중 정체성의 일부분으로 쪼그라든 까닭일 테다.
그런데 정말 국가적 정체성은 더 이상 유의미한 장이 아니게 되었는가? 나는 아직 국가적 정체성이 여타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지 않았다. 내 주장의 핵심은, 개인이 국가적 정체성에 종속되지 않더라도 국가적 정체성이 함정에 빠지는 경우 결국 개인의 정체성도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옥시덴탈리즘(occidentalism)은 “서양의 적대자들이 서양을 비(非)인간적이라고 묘사하는 것”으로 내부 통치 논리로 악용되는 국가적 정체성이다.52 비서구권은 서구 추종과 근본주의라는 양자택일에 놓이는 것 외에도 적극적으로 서구를 타자화하는 선택지 또한 갖고 있었다. 가령 “자유로운 서구는 그 소심함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마비되어 있다고 비난”하거나 “계산적인 서구는 어느 행동이 옳은가 그렇지 않은가를 놓고 끊임없이 논쟁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평가함으로써, 거꾸로 과감하고 비민주적인 결정이 자연스럽게 정당화되곤 했다.53
이제 그 연장선에서 BTS의 리더 RM이 스페인 매체 엘 파이스(El Pais)와 진행한 인터뷰 속 K-POP에 대한 시각을 의심스럽게 바라본다:
“기자: 말씀하신 젊음과, 완벽주의, K-POP을 위한 엄청난 노력. 이런 것들이 한국 문화의 특징인가요?
RM(방탄소년단): 서양 사람들은 이해 못 합니다. 한국은 침략당하고, 파괴되었고, 둘로 갈라진 나라입니다. 70년 전만 해도 아무것도 없던 나라입니다. 우린 IMF와 UN의 원조를 받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건 바로 우리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 혹독하게 일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나 영국처럼 수 세기 동안 다른 나라를 식민지화했던 나라의 사람이 저를 보고 “세상에, 한국 사람들은 스스로를 너무 압박해요, 한국에서의 삶은 너무 스트레스가 많네요!”라고 하죠. 그래요. 우린 그렇게 목표를 달성해왔거든요. 그리고 이 방식이 K-POP을 그토록 매력적으로 만드는 점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부작용도 있겠죠. 모든 일이 그렇듯이요.”54
나는 ‘풍요와 여유의 서구’ 반대편에 ‘혹독한 허슬(hustle)이 미덕인 한국’을 놓는 이 인터뷰를 개인의 실언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사회 현상으로 이해한다. 그러니까 한국적 관점에서 K-POP은 인권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서구와 달리 청소년 억압과 승자독식을 용인한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다.55 서구는 영영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같은 맥락에서 아이돌은 엄연한 상품으로 사상을 검증받아야 하며 당연히 연애 감정도 제한해야 할 것이다. 무엇이든 자신의 직업 선택 결과이므로 사회가 책임질 것은 없다. 개인이 한국적 정체성에 속박되지 않더라도 한국적 정체성은 서구와 대비되는 한국 사회 구조를 정당화하고 그 문제점을 부작용쯤으로 축소해 버린다.
<인어공주> 논쟁으로 돌아오면, 현재 (2) 가장 경계해야 할 흐름은 서구가 ‘인종주의에 대한 반성적 문화’를 쫓다 실패하므로 한국은 다양성 추구 없이 상업성에 집중해야 한다는 옥시덴탈리즘이다. 서구는 영영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영화는 상품이므로 감독은 다양성을 추구한 데에 상업적 대가를 치러야 한다. 무엇이든 제작진의 선택이므로 사회가 책임질 것은 없다. 실은 무엇이든 제작진의 선택이라 한들 그런 사회가 정당화될 이유는 없지만 그렇게 되고 만다. 한국 사회가 아직 가지 않은 길은 환상의 서구가 이미 걸어 실패했기 때문이다.
일차적으로 이것은 홀이 제시한 두 번째 가능성, 세계화에 대한 저항으로 국가적 정체성이 강화되는 경우로 분류할 수 있겠다. 그러나 한국이 겪는 상업성과 다양성의 대립은 다소 불합리하게도 서구과 경험하는 상황보다 난해한 것이다. 단일민족·단일인종 환상에 영향받는 개인은 반성적 문화가 생소하고 어색할 수 있고, 혹여 반성적 문화를 선진적이라 여긴다면 – 한국의 미래는 서구의 현재가 아니라 한국의 미래일 뿐이지만 – 서구의 결론을 ‘언젠가 도래할 것’으로 섣부르게 선망할 수 있다. 반대로 한국적 정체성은 그러한 서구의 결론을 깎아내리는 방향으로 공고해져 반성적 문화를 배격하고, 다시 반대로 인종주의란 세계 시민에게 반성의 대상이니 어떤 문화든 반영해야 하는 듯 보인다. 우리는 이 삼중 구조 속에서 무엇이 무엇과 대립하는지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다.
이렇듯 (3) 다중 정체성은 대립 구도를 파악하기 까다롭게 만들어 옥시덴탈리즘을 은폐하고 심화한다. 이미 우리는 상업성을 이유로 다양성을 배제하고, 배제한 만큼 상업성을 가치관에 더 채워 넣는 재귀적 사고의 확산을 목격하고 있다. 국가적 문화 정체성은 초연결 시대에 가려져 드러나지 않더라도 여전히 지배적이었던 셈이다. 반성적 문화를 둘러싼 서구의 논쟁이 기술 발전과 동시대 관객성을 통해 한국으로 침투했으나, 정작 어떤 한국적 정체성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는 외면받아 길을 잃었다. 그 결과 한국적 정체성은 막후에서 반성적 문화에 부정적인 우군을 늘려나가는 중이다. 한편 새 시대의 다중 정체성은 국가적 정체성과 달리 어느 링 위에도 서지 않으면서 도전받을 가능성을 회피한다. 전선이 명확하지 않으니 관성에 대한 회의가 지체된다. 이것이 보수주의, 혐오, 반지성주의, 백래시 등 상투적인 용어와 이분법적 구도로는 설명하지 못할 <인어공주> 논쟁의 복잡성이다.
마치며
“디즈니는 노동정책이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않는다고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강력한 문화 권력과 거대 기업의 실체를 순수함으로 위장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비난받아야 한다.”56
더 나은 미래를 바라는 게 우리의 소원이라면, 우리는 소원을 빼앗기고 있다. 지금까지 나는 반성적 문화를 지향함에 있어 비서구권 국가가 불합리한 처지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그 원인이 되는 강력한 문화권력은 마침 <위시>의 악역 매그니피코 왕이 대변하고 있다. 매그니피코가 모든 국민의 소원을 위탁받아 ‘왕국에 무해한 경우’ 매달 한두 개씩 이뤄준다는 설정은, 지구상 무수한 문화가 디즈니로 모여 제한적으로 영화화되고 소모되는 불편한 현실을 들춘다. 로사스 왕국에 도착해 소원을 바친 사람은 우울해지지만 달리 대안은 없다. 마법이 로사스에 있고, 기술과 자본이 디즈니에 있기 때문이다. 100주년을 맞이한 디즈니는 자신을 상징하는 마법의 왕국 로사스를 통해 여느 때보다도 자기 비판적인 플롯을 시도한 것이다. 비록 어떻게 탈권력을 이룩하고도 지속할 것인지 설명하고 대안을 내놓아야 할 순간 안전하고 편의적인 연출로 사그라들지만 말이다.
우리의 미래는 결국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지금 한국에 필요한 것은 한국 내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다문화 청소년, 탈북민, 동성애자 등”57에 대한 반성적 문화를 한국적 정체성에 반영하는 과정이고, 반대로 필요하지 않은 것은 글로벌 문화 권력과 동시대 관객성이 불러들인 모호한 관점들이다. 어디까지나 참고로 삼아야 할 <인어공주>보다는, 차라리 프로파간다 영화로 지목당한 <국제시장>(2014)이 우리에게 더 가치 있다. “남의 나라 일하러 오면 커피도 못 사묵나?” 스리랑카 노동자를 향한 학생들의 인종차별에 주인공 덕수(황정민 扮)가 격하게 반응한다. 현대 한국사를 거쳐온 그가 바로 일본, 베트남, 독일에서 일했던 외국인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그 겹쳐짐이 한국 내 외국인 노동자를 가시화하며, ‘부산에 살면 부산 사람이고 한국에서 살면 한국 사람’이라는 항의를 와닿게 한다.
물론 비가시성을 대체하는 것은 ‘허용된 가시성’으로 제한되기 마련이다.58 <국제시장>에서 스리랑카 노동자 역을 맡은 배우 아누팜 트리파티는 7년 후 <오징어 게임>(2021)에서 파키스탄 노동자 알리 압둘을 연기하지만 ‘사장님’과 ‘선생님’에게 희생당하는 선량한 이방인에 그친다. 2013년 코너 ‘황해’로 조선족 보이스피싱을 보여준 <개그콘서트>는 10년 후 현재 ‘니퉁의 인간극장’에서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을 정형화된 모습으로 다루고 있다. 니퉁이라는 캐릭터는 고부갈등 풍자가 주된 목표더라도 소수자의 어떤 이미지가 선택받고 허용되는지 드러낼 따름이다.59 그리고 이런 공개 코미디 또한 ‘한국의 이주민이 보기에 어떠한가’ 대신 ‘세계가 보기에 어떠한가’로 문제 삼기 시작하면 역시 혼란스러운 삼중 구조로 빠져들 우려가 있다.

그럴수록 국가를 문화 교섭의 장으로 삼는 바바의 전략을 다시 떠올려보면, 대항문화가 창발하게 둠으로써 우리는 ‘우리’라는 상상의 공동체 내 이질성을 인지하고 진정으로 선진(先進)할 수 있다. 하위계층이나 소수자 행위자는 “사회의 ‘상호관심사’를 질문하고 재분절해서, 그 관심사들을 한계화시키려 시도할 수 있다.”61 남은 과제는 교섭의 장을 어떻게 현실화할지다. 하지만 나는 새 시대의 문화 생산 양상에서 좀처럼 돌파구를 떠올리지 못하겠다. 단일민족·단일인종 환상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콩고 이주민 셀럽이 저절로 등장해야 한다. 힙합은 배고픈 음악이라지만, 한국 힙합 씬에는 조선족 정체성을 진솔한 가사로 담아낸 래퍼가 저절로 주목받아야 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찾거나 보고 들어야 돈이 되는 시스템에서 ‘저절로’는 아무래도 무책임하다. 현대 뉴미디어의 양극화와 배제적 지형을 고려하면, 사적 영역에서는 우연에 의존해 슈퍼스타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내심 영화에 기대를 걸고 싶지만 마찬가지로 녹록지 않다. 워너 브라더스의 100주년은 디즈니보다 사정이 나아서 페미니즘 영화 <바비>를 당당하게 흥행시켰으니 일견 목적을 이룬 듯하다. 그러나 상업성이 반성적 문화에 기여한다는 주장에 계속 동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교섭은 언뜻 자유로워 보이지만 자본이라는 조건 하에 이루어진다. 나는 더 많은 관객을 동원해 더 많은 투자를 받고자 할 한국 상업 영화들이 저절로 한국의 소수자를 대변할 것이라 낙관하지 않는다. 그리고 더 많은 투자에 힘입어 더 좋은 평가를 받고자 한다면 권위 있는 외국 영화제 수상이 더 많은 관객 숫자로 이어질 것이라 비관한다. 아카데미 시상식은 봉준호 감독의 말마따나 로컬 영화제에 불과하지만,62 ‘선진적이라는 인식’은 여기에도 어김없이 작용한다.
어떻게 ‘우리’ 안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인가? 마지막 문단에 이르러서도 나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탓에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다. 다문화·이주민 시대 한국은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그 길마저 빼앗긴 탓에 오갈 데 없다. 서구로부터 독립적이고 자본으로부터도 자유로운 방식으로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가 이렇게나 어려운 줄 몰랐다. 나는 더 이상 어쩌지 못하는 대중의 일원으로서 동료 시민에게 막연한 질문만 남긴 채 글을 마친다. 다만 모깃소리보다도 더 작은 목소리로, 한 가지만큼은 확실하게 중얼거리려 한다. 높은 문화의 힘이란 적어도 문화를 만족도와 평점으로 재단하는 사회에선 달성하기 요원할 것이다. 의심스럽다면, <인어공주>에 매기는 별점이 이 리뷰를 대신할 수 있을지 헤아려보라. ‘<인어공주>: ★★★’
※ Special Thanks to 김상우 (카이스트 전산학부 석사 졸업, woodmac@kaist.ac.kr), 칼립소 음악 관련 자문
읽을거리
헨리 지루, 성기완 번역 (2001), 『디즈니 순수함과 거짓말』, 아침이슬 [Giroux, H A. (1999) The Mouse that Roared: Disney and the End of Innocence,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만약 관람객들이 영화의 이념적 의미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다면 그 희열은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p.106) 나는 디즈니 영화에 대한 좋은 기억이나 평가와 정치적 관점에서의 문제의식이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책은 독자들이 방어적 태도를 버리고 감상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
References
1「아직도 정치적 올바름이 불편한 당신에게」, http://www.snujn.com/news/62056
2 “Disney CEO Bob Iger says company’s movies have been too focused on messaging”, https://www.cnbc.com/2023/11/30/disney-ceo-bob-iger-says-movies-have-been-too-focused-on-messaging.html
3 홍상수. (감독). (2010). 옥희의 영화 [영화]. 전원사.
4 Keyte, G. (2023). Producer John DeLuca, Cinematographer Dion Beebe, Director Rob Marshall [Photo]. Daum. https://t1.daumcdn.net/movie/89ca20ab45ba7f7404d9a76bed3daa33c279f831
5 [<완벽한 도미요리> 中]. 서울독립영화제. https://siff.kr/films/완벽한-도미요리/
6 김수영. (2018). 「시여, 침을 뱉어라」. 김수영(편저), 김수영 전집 2 (p. 503). 민음사.
7 Prince Eric and Ariel in The Little Mermaid [Online image]. (2023). Yahoo News. https://news.yahoo.com/little-mermaid-director-alan-menken-020547255.html
8 The Little Mermaid Is NOT Set in Denmark. (2018, July 16). Disney Wiki. https://disney.fandom.com/f/p/3318458582303008998. 디즈니 팬덤의 토론.
9 “‘Little Mermaid’ Director, Cast Address Colorblind Casting and the Power of a Black Ariel”, https://www.yahoo.com/entertainment/little-mermaid-new-ariel-halle-bailey-interview-disney-remake-171141213.html
10 Castagne, P. S. (1958). “THIS IS CALYPSO”. Music Journal, 16(1), 32. https://www.proquest.com/scholarly-journals/this-is-calypso/docview/1290816842/se-2
11 Lebkowsky, J. (2007). Steel Ddrums [Photo]. https://www.flickr.com/photos/weblogsky/384299108
12 Dudley, S. (2002). “Lovey’s Original Trinidad String Band” (1912). Library of Congress. https://www.loc.gov/static/programs/national-recording-preservation-board/documents/Loveys-Original-Trinidad-String-Band_Dudley.pdf
13 Harry Belafonte. (2015, August 12). Day O (Banana Boat Song) [Video].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YO7M0Hx_1D8
14 The Esso Trinidad Steel Band – Topic. (2014, April 12). I Want You Back [Video].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wgOEWOhu-Ps
15 David Rudder. (2015, August 25). Bacchanal Lady [Video].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JnDbXqFIldE
16 “The Holy Trinity of Trinidadian Music”, https://medium.com/1ntune/the-holy-trinity-of-trinidadian-music-8969644f70cc
17 mermaidtingz. (2022, August 22). There are black People in Denmark but also Ariel is NOT danish. [Video]. X. https://twitter.com/arielandhalle/status/1557920419805642754?s=46&t=8ndOf4ksDgx8xckHR8GGqQ
18 “A brief history of the steel pan”, https://www.bbc.com/news/magazine-18903131
19 김용호. (2017). 「카리브 대중음악 칼립소에 관한 연구 : 기원에서 카리브통합운동까지」, 『이베로아메리카연구』, 제28권 제2호, p. 98.
20 “Courts Find ‘Rum and Coca-Cola’ Was Plagiarized”, http://www.metnews.com/articles/2006/reminiscing041306.htm
21 Cultural Appropriation. (n.d.). Oxford Reference. https://www.oxfordreference.com/display/10.1093/oi/authority.20110803095652789
22 헨리 지루, 성기완 번역 (2001), 『디즈니 순수함과 거짓말』, 아침이슬, p. 41. [Giroux, H A. (1999) The Mouse that Roared: Disney and the End of Innocence,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23 Ibid., p. 117.
24 윌리엄 셰익스피어, 이경식 번역(2009), 『템페스트』, 문학동네, pp. 139-140.
25「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건 무엇인가」, https://www.joongang.co.kr/article/14598644
26 “Where Was The Little Mermaid Filmed? Disney Remake’s Filming Locations Explained”, https://screenrant.com/the-little-mermaid-remake-filming-locations-explained/
27「디즈니, ‘흑인 인어공주’ 논란에 일침…”덴마크인 흑인도 있다” 」, https://www.yna.co.kr/view/AKR20190709061700009
28 ““La Sirenita”: 6 curiosidades que guiaron la creación de su banda sonora”, https://revistasincericidio.com/2023/05/26/la-sirenita/
29 Disney. (2016, June 5). Mulan | I’ll Make A Man Out Of You | Disney Sing-Along [Video]. Youtube. https://youtu.be/TVcLIfSC4OE?si=Tp8l6cfQun5LlNaQ
30 “How The ‘Kung Fu Fighting’ Melody Came To Represent Asia”, https://www.npr.org/sections/codeswitch/2014/08/28/338622840/how-the-kung-fu-fighting-melody-came-to-represent-asia
31 Frith, S. (1996). “Music and identity”. In S. Hall & P. Du Gay (Eds.), Questions of cultural identity (pp. 108–127). Sage Publications, Inc.
32 “Step by Step: How Kingsley Ben-Adir Became Bob Marley”, https://www.nytimes.com/2024/02/16/movies/kingsley-ben-adir-bob-marley-one-love.html
33 [<밥 말리: 원 러브> 촬영장]. Daum. https://t1.daumcdn.net/movie/97db30ba281314e18e5dd08e7a566ff8dd3ba26f
34 “Is it OK for a white kid to dress up as Moana for Halloween? And other cultural appropriation questions”, https://www.usatoday.com/story/news/2017/10/23/halloween-cultural-appropriation-questions/780479001/
35「이봉원, “’시커먼스’ 흑인 비하 논란 우려해 폐지」,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8/26/2010082600532.html
36「웃찾사, 홍현희 ‘흑인 비하’ 논란에 공식 사과」, https://m.khan.co.kr/culture/tv/article/201704211726001#c2b
37「탈식민주의 이론의 始原 」, https://www.khan.co.kr/article/200410221715391
38 에드워드 사이드, 박홍규 번역 (2005), 『문화와 제국주의』, 문예출판사, p. 20. [Said, E. (1993) Culture and Imperialism, Vintage Books (Random House).]
39 Ibid., p. 22.
40 “Disney’s Little Mermaid flops in China amid racist backlash over casting”, https://www.theguardian.com/film/2023/jun/09/disney-little-mermaid-flops-china-racist-backlash-casting
41 호미 바바, 나병철 번역 (2012), 『문화의 위치』, 소명출판, p. 202. [Bhabha, H. (1994) The Location of Culture, Routledge.]
42 에드워드 사이드, 박홍규 번역 (2007), 『오리엔탈리즘』, 교보문고, p. 357. [Said, E. (1978) Orientalism, Pantheon Books.]
43 김수영, op. cit., p. 503.
44 에드워드 사이드, 박홍규 번역 (2005), 『문화와 제국주의』, 문예출판사, p. 553. [Said, E. (1993) Culture and Imperialism, Vintage Books (Random House).]
45 Hall, S. (1992). “The Question of Cultural Identity”. In: S. Hall, D. Held and T. McGrew (Eds.), Modernity and Its Futures. p. 300. Milton Keynes. Cambridge: Open University Press.
46 홍수정. (2023, April 24). 「’동시대 관객’이라는 감각의 상실」. 브런치스토리. https://brunch.co.kr/@comeandplay/880
47 [Thumbnail from LIM KIM – ‘YELLOW’ M/V].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o5S3sPpkd8w
48 호미 바바, op. cit., p.254.
49 Ibid., p. 203.
50 Ibid., p. 321-322.
51 Ibid., p. 349.
52 이안 부루마, 아비샤이 마갤릿, 송충기 번역 (2007), 『옥시덴탈리즘』, 민음사, p. 16. [Buruma, I., Margalit, A., (2004) Occidentalism: The West in the Eyes of Its Enemies, Penguin.]
53 Ibid., p. 115.
54「“왜 그렇게 노력하냐고?” 식민지배했던 나라에 방탄 ‘RM’이 날린 한 방」,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626144
55「[박권일의 다이내믹 도넛] ‘그쪽이야말로주의’를 넘어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31767?sid=110)
56 헨리 지루, op. cit., p. 160.
57「사회적 소수자(社會的 少數者)」. (n.d.).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78931
58 Hall, S. (1993), “What is this ‘Black’ in Black popular culture?”, Social Justice, 20(1/2), p. 107.
59「“20년 전과 달라진 게 없다”···개그 프로그램 여전한 ‘동남아 패러디’」,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11261625001
60 [‘니퉁의 인간극장’ 中]. Daum. https://v.daum.net/v/20231206075125315
61 호미 바바, op. cit., p. 407.
62「“아카데미는 로컬” “트로피 5등분”… 오스카 울리고 웃긴 봉준호 명대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21017393760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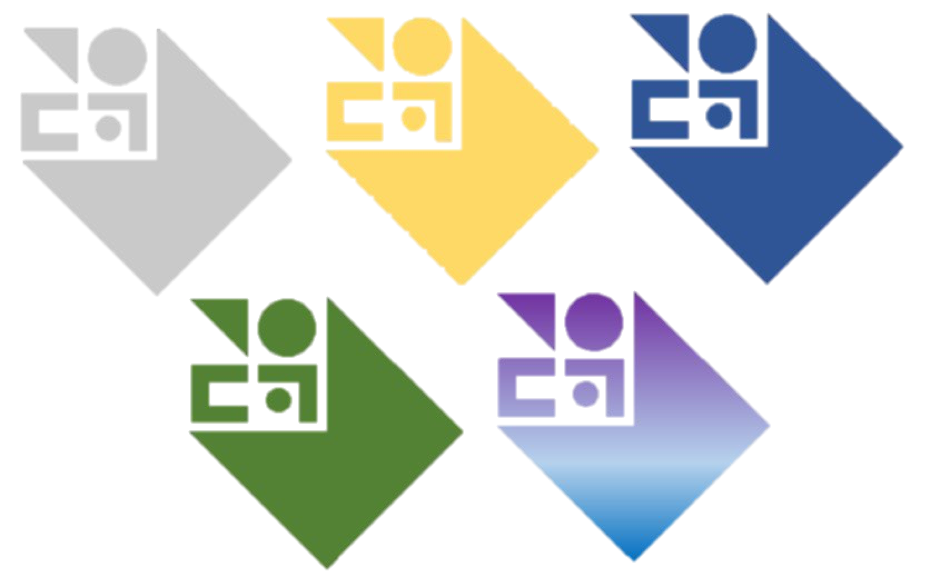
댓글 남기기